 독서토론방 독서토론방 | Home>독서토론 |
교육계발 <읽지 않은 책에 대해 말하는 법>을 읽지 않고 말하는 법
페이지 정보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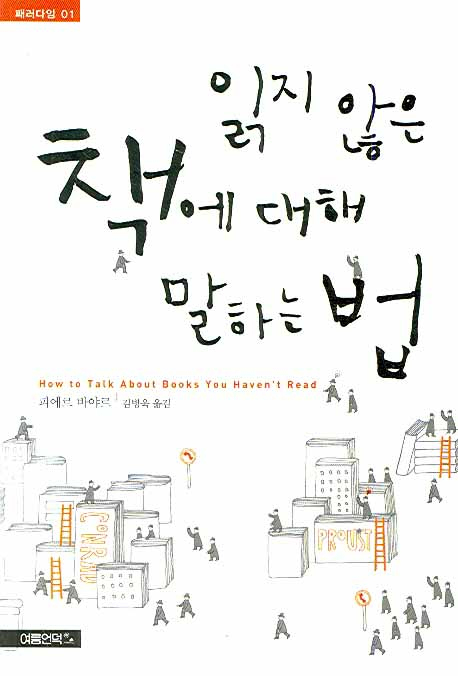
“당신은 최근에 어떤 책을 읽으셨습니까?”
“당신은 얼마나 책을 많이 보십니까?”
“당신의 인생을 바꾼 책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군가에게서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반가워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소위, 정보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식의 중요성은 날로 부각되어 가는 반면, 신자유주의 경쟁 속에서 바삐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책을 붙잡고 있을 여유를 마련해내기란 점점 힘든 일이 되어가고 있죠. <논어>를 통해 ‘학이시습지 불역열호’를 음미하던 공자의 시대와 달리, 우리는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배워야만 하는 자기계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공자님 시대보다 많은 책을 접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지혜는 가지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분명히 우리들은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던, 문맹 인구가 부지기수였던 시대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인터넷과 같은 정보 기술의 발달은, 문맹의 시대를 논한다는 것이 우스워질 정도로, 누구나가 쉽고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용자 스스로 필요로 하는 지식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의 법칙처럼, 과도한 양적 팽창은 오히려 질적 하락으로 통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식in이 초딩들의 범람으로서 정보의 바다를 이룩한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매주마다 신간들이 쏟아져 나오는 서점가를 직접 방문하여 내 인생의 가장 감명깊을? 책을 찾아낸다는 것조차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보라는 바다의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지식을 활용할 공간인 육지가 좁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정보화 시대의 지식이란, 나아가면 갈수록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바다와도 같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해낸다는 것은, 단지 망망대해를 향해 노를 젓는 것이 아닌, 목표지점을 설정하여 가장 빠른 항로를 만들어가는 것에 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작정 지식을 쌓기에 앞서, 지식을 쌓는 방법론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피에르 바야르의 <읽지 않은 책에 대해 말하는 법>은 바로 이러한 점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해 줍니다.
이 책을 곧장 활용한다면, 우리는 <읽지 않은 책에 대해 말하는 법>마저도 읽지 않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단지 지식 습득의 도구로서만 책을 활용하는 경우, 책은 정독되어야 할 당위를 갖지 않습니다. 포탈검색을 할 때 초딩을 걸러내듯이, 우리는 책에 기죽지 않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내용만 소화해내고 나머지는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지금 그러하듯이, <읽지 않은 책에 대해 말하는 법>이라는 책을 직접 읽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관련문헌을 '스캔'하고, 저자가 의도한 주제의식을 적절히 '파악'하고, 이를 자신이 의도하는 주제의식에 알맞게 ‘활용’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오늘날, 책을 완벽히 ‘읽는’다는 것은 지식과 정보의 쓰나미에 휩쓸린 채 본질을 ‘잃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지식 권력?은 지식을 갖지 못한 대중들에게 계속하여 ‘오늘의 추천도서’를 지정하는 등, 독서의 당위를 부여하지만 추천도서들을 다 읽는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그래야만 하는 것도 아닌거죠. 여행에 비유한다면, 우리는 중국을 알기 위해 중국의 모든 곳을 다녀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다못해 북경반점에서 중국요리를 맛볼 여유조차 안 생기면, 그저 ‘가보지 않은 곳에 대해 말하는 법’을 터득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중국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해외여행의 목적이 타문화에 대한 이해에 있다고 전제한다면, 간접경험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여행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실은 대중들에게 알려진 베스트셀러 여행기도 여행 자체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저자가 여행에 대해 ‘말하는 법’에서 비롯된 작품이죠.
정보과잉의 시대에서 지식의 본질은, 지식 권력이 만들어 준 텍스트를 달달 외우는 것이 아닌, 스스로 지식 주체가 되어 세상에 산발되어 있는 아이템들을 취합하여 자신만의 텍스트를 만들어 내는 것에 있습니다.
또한 책읽기의 본질이 이러한 지식 습득에 있다고 전제한다면, 우리는 <읽지 않은 책에 대해 말하는 법>이라는 일종의 역설적 표현으로부터, 정보 시대에 알맞은 새로운 방법론으로의 전환을 시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책을 읽기에 앞서서, 정작 중요한 ‘책을 말하는 법’, 즉 자신의 언어를 만들어 내는 연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맹목적인 암기가 학생 시절의 고역일 뿐 시험 뒤에 무너지는 탑이 되는 것처럼, 독서에 지나친 권위를 부여하는 일 또한 본질을 벗어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읽은 책에 대해 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 읽지 않은 책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는 것이 올바른 책읽기일 것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