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토론방 주제토론방 | Home>토론게시판>주제토론방 |
기타 관용을 위한 불관용
페이지 정보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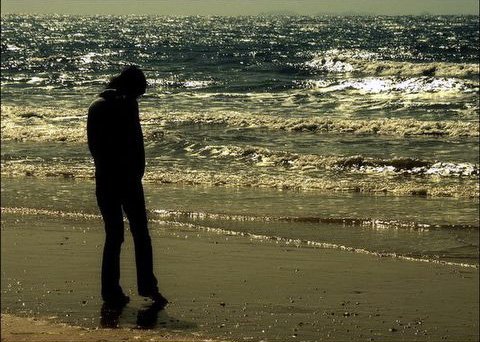
관용은 과연 미덕일까?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관용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어사전을 참고한다면, 관용(寬容)이란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관용은 과연 미덕일까요?
잘못을 용서해주는 태도는 때에 따라서 악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잘못에 대해, 사전적 정의 그대로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할 수 있어야 할까요?
필리프 사시에의 저작, <민주주의의 무기, 똘레랑스>를 번역한
홍세화의 인터뷰를 인용한다면, 이러한 의문에 대해 “관용보다는 용인입니다.
아랫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인다기보다,
종교나 사상이 달라도 그 ‘차이’ 자체를 다른 그대로
참고 받아들인다는 정신 자세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덕으로서의 관용은, 그저 잘못에 대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의 기준 자체가 ‘차이’에서 올 수 있음을 인식하고,
그 차이를 서로 존중해줌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미덕으로서 관용이란, 그저 고도의 인격 수양을 위한 도덕이 아닌,
우리가 살아갈 민주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조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은,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첫 단계로서
“의견의 불일치를 받아들이고 도덕적 분쟁을 인정하는” 관용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죠.
한국과 같이, ‘의견의 일치’를 중시하고, ‘분쟁을 불인정’하고
정치 자체에 대해 냉소하는 문화에 있어서 관용의 미덕은 더욱 주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로의 첫 단계로서 불일치와 분쟁이 발생해야만,
그 다음 단계로의 ‘진정한 화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관용의 미덕은 경제학적 관점에서도 주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미 토론토대학의 리처드 플로리다 교수는 <창조적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이란 책을 통해,
탈(脫)산업사회의 이윤창출 원천은 창조성에서 비롯되며,
창조성에 의한 경제적 성과는 바로 공동체 내에서 차이를 용인하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이테크지수와 게이지수의 상관성,
즉 특정 지역의 하이테크놀로지의 발전도과 성적 소수자가 거주하는 비율은
정관계로서 상호관련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관용의 미덕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적 특질에 불과한 것이 아닌,
하이테크지수와 게이지수의 상관성, 즉 눈에 보이는 성과로도 드러나는 주요한 가치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례를 통해 우리는 관용의 미덕이 고도의 인격수양을 위한 군자의 도덕에 불과한 것이 아닌,
정치적 민주사회, 경제적 탈산업사회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기본전제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관용이란, 그저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태도보다는,
오히려 ‘불관용과 같은 잘못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는 태도’에 그 본질이 있다고 할 수 있죠.
관용의 패러독스에 빠져서, 불관용의 태도마저 용서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될 것입니다.
미덕으로서 관용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불관용에 관한 불관용의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관용을 위한 불관용’이 미덕이 되어야만 정의로운 사회로 향하는 첫 단계가 완성되며,
창조성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적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불관용이 바로 '미덕으로서 관용'이라 할 수 있겠죠.
댓글목록

백색괴물님의 댓글
백색괴물 작성일관용이라는 것은 거지에게 동전을 던지는 것이 관용입니다. 그러라고 하는게 관용을 미덕으로 알라 라고 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백색괴물님의 댓글
백색괴물 작성일고대 사회에서 관용을 미덕으로 삼으라 하고, 고대 종교들이 다 관용을 강조하는 이유는, 고대 사회가 그만큼 만민의 불평등과 그로 인한 빈부격차의 극심함에 달해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노예나 못 사는 평민들은 말 그대로 자신들이 그렇게 태어난 죄일 뿐이고, 그들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굴레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잘 알기에 가진 자들, 귀족, 왕족, 부유층들에게 관용을 강조하며 평민 및 노예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인류 최초의 복지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백색괴물님의 댓글
백색괴물 작성일현대로 가봅시다. 자본주의,민주주의,자유주의의 세계적 정착으로 개개인이 못 사는건 순전히 개인의 무능함과 게으름 때문이고, 애초부터 귀속적으로 부유해질 수 없는 운명을 타고난 고대 사회와는 차이가 있지요. 그로 인해 미국과 같은 자유주의 국가들은 관용은 커녕 공공,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냉랭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카네기라던지, 록펠러라던지 하는 거대부호들 말이지요. 그러나 이들이 살아 생전의 자본주의,자유주의는 철저하게 자유방임주의적이라 부유층,기득권의 독과점으로 노동자와 자본가라는 넘을 수 없는 커다란 갭을 형성한 것이지요. 이들 역시 위에서 언급한 고대 사회와 일맥상통하는 이유로 기부를 한 것입니다.

Idler님의 댓글
Idler 작성일
'관용'이란 어휘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것같네요.
똘레랑스라는 말을 관용으로 번역하곤 하지만,
사실, 잘못을 용서하는 관용과는 의미가 다른 것이죠.

붉을홍님의 댓글
붉을홍 작성일용서 라는 말은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